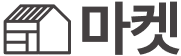“꿈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디스코 뽕짝 코미디 잡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체험을 기록합니다.” 잡지 ‘록’셔리’를 만드는 현영석씨가 말했다. 명품 브랜드를 다루는 잡지 에서 영감을 얻었다. 정확히 그 반대편의 잡지를 구상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위안을 받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잡지였다. 배수로에서 썰매타기, 폐가에서 캠핑하기 등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사진과 함께 기록한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절로 웃음이 터졌다. 1월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잡지 제작자들의 행사 ‘스틸 진 매터스(Still, Zine Matters)’ 풍경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월간 이리’, ‘스켄트(SCENT)’, ‘아프락사스’, ‘하우 위 아(How We Are)’ 등 등 독립 잡지라고 불리는 10개 잡지의 제작자들이 각자 만드는 잡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 편집장 피터(김용진)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 ‘신촌서당’은 제작자들만으로도 자리가 꽉 찼다.
이는 잡지의 태생적 특성이기도 하다. 상업지들도 마찬가지였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123편의 잡지 창간사를 분석한 책 에서 “잡지는 신문과 달리 단지 몇 명의 동인들만으로도 발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수익과 최소한의 독자와의 피드백만 있으면 재생산이 가능한 매체다. (중략) 아마추어들도 얼마든지 잡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잡지는 명멸과 부침이 매우 심하다. 얼마나 많은 잡지가 언제 나타났다 사라져갔는지 파악하기 실로 어렵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싱클레어’는 지난 잡지들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립 잡지는 이제 기록을 고민하고 있다.